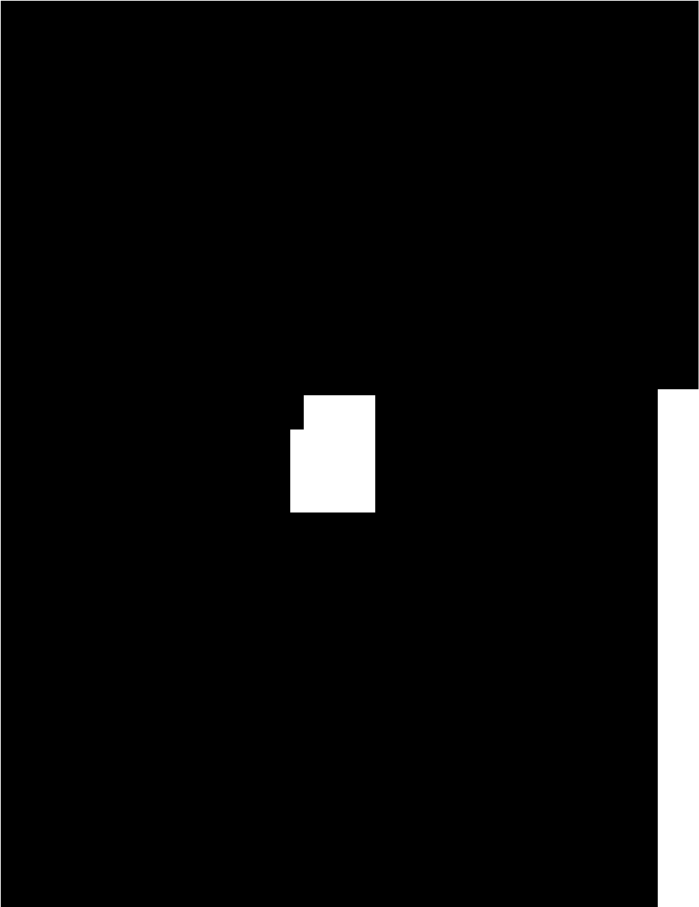몇 해 전 겨울, 나는 한 화가의 개인전에 갔고 거기서 불 그림을 봤다. 그리 크지 않은 캔버스는 푸르고 벌겋고 노랗고 거무튀 튀하고 또 새하얀 불의 결들이 한데 이글거리며 흔들리는 한 덩어리의 불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 그걸 불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불이라고 말하고 나면 이 말은 불에 닿자마자 허깨비처럼 흩어진다. 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체적이지 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이미지로서 실체적일 때인 것 같다. 숲, 어둠, 바다나 구름 같은 것들처럼. 공통점이라면 무 엇이든 일 것 같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이고 우리를 그 둘 사이에 가둬 헤매게 만든다는 것. (모험적인 사람에게라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매혹적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은 ‘이미’ 매혹적인 것이다. 이미 매혹적이라는 건 직접 마주치기 않았더 라도 그것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 직접 마주친 걸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불의 사건은 나타남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기억해 낼 수 있는 건 내가 연 루되기 시작한 것이 까마득한 옛날이었으며 웬만해선 앞으로도 벗어날 일 없다는 사실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내가 그날 전시장에서 매혹된 건 그림이 아닌 것 아닌가 헷갈린다. 왜냐하면 불은 이미 매혹적이니까. 아니다. 불을 기억하고 그 매혹을 또한 기억나게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란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니 내가 겪은 건 그림에 대한 매혹이 맞다. 종종 어떤 불-이미지 를 품은 작품은 닿지는 못하지만 무언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우리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는 느낌을 준다. 그게 무엇 인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긴 그게 무엇인지 아는 척하거나 거기에 다다른 척한다면 우리는 이 미 허깨비의 꿈에서 진작에 깨어났겠지.
조르조 아감벤은 「불과 글」이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불은 태초의 신비의 자리이고 인간은 점차 불을 상실해 갔으며 신비를 잊 은 것에 대한 기억이 바로 우리가 글(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문학이 신비의 자리를 대 체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문학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도구가 된다. 현란한 글 쓰기와 텍스트의 무더기는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고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아감벤의 주장과 전적으로 반대에 놓이는 것이다. 아감벤의 말을 빌려 거듭 말해보자면 “모든 문학은 불의 상실에 대한 기억”이다. “글이 있는 곳에 불은 꺼져 있 고 신비가 있는 곳에 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생각에 따르면 불, 즉 신비는 글과 양립할 수 없다. 불이 꺼져버렸기에 우리 는 글을 쓸 수 있고, 글에 남은 그 치명적인 상실의 흔적이 신비를 향한 문학적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쓰기는 기억하기를 위한 노력이다. 만약 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을 빼앗고 하나의 영구적인 이미지가 될 것이다. 불은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수 없는 이미지다. 열에 아홉은 그저 멍해질 뿐일 테다. 나는 문학의 의미, 그리고 문학이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불과 관련하여 말하는 아감벤의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왜 불에 매혹될 뿐만 아니라 글과 책에 매혹되는지에 대해서 짐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읽 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서관을 만들고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는 않지만 생소한 행정적인 일들이 몇몇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재 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을 행정 부처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도서관이라는 곳을 위협하는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렇지, 책은 종이로 만들어졌고 종이는 불에 잘 타지. 불이 나면 도서관의 가장 중요 한 자원인 책은 모두 불타 없어지겠지.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곳도 더는 가능하지 않겠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서관 에 불이 나 책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내겐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책이 모두 불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 을 때, 그 텅 빈 곳이 어쩌면 더 도서관스러울 수 있겠다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다. 사실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고 쌓아나가는 곳 이 아니라, 하나씩 빼고 지워나가야 하는 곳이 아닐까?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작은 불씨가 생기도록 노력하고 불덩이 주위로 사 람들이 하나둘 모이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신비를 기억하는 픽션들을 위한 장소인 도서관에는, 필연적으로 책뿐만 아니라 불의 이미지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이미지는 어떻게 불러낼 수 있을까?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 화가에게 전시 잘 보았노라고, 그리고 전시장 안쪽 방에 있던 불 그림이 좋았노라고 말했더니 화 가는 의아한 얼굴로 그 전시에는 불 그림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딘가에서 봤던 그의 불 그림과 헷갈렸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불을 보기는 봤는데 그게 그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불이란 건 사실 종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그림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이상한 채로 내버려두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