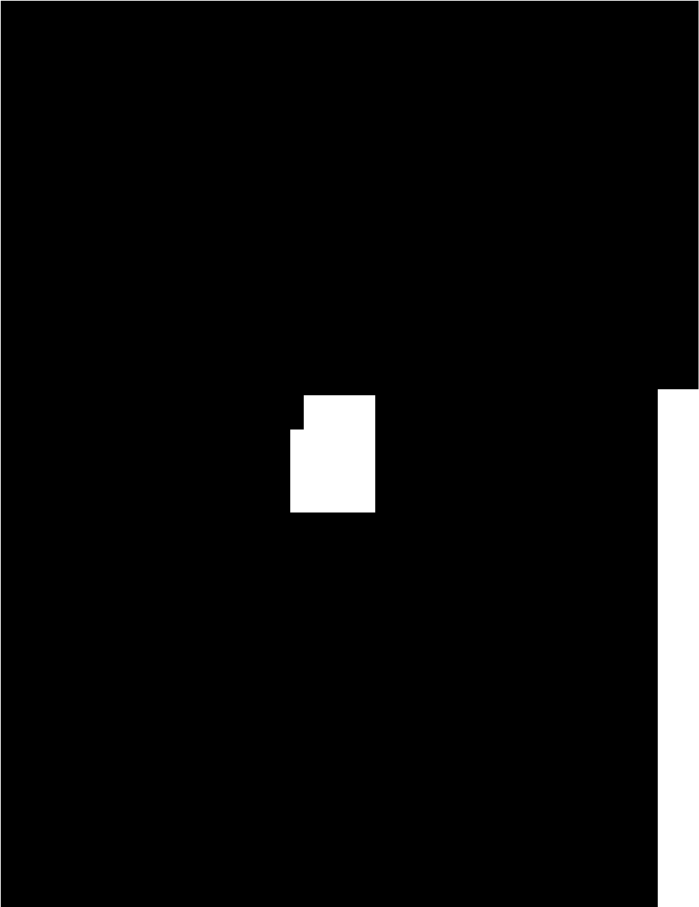부푼 빵의 발견은 매우 우연히 이뤄졌을 것이다. 밀과 물을 섞어 놓은 반죽을 깜빡 잊고 미처 굽지 못한 날, 반죽 속에 있던 미생물들은 물과 산소, 온도, 시간의 힘으로 발효인지 부패인지 그 때는 몰랐을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 변화를 발견한 호기심 많던 한 인간은 그 낯선 반죽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불에 구워 보았을 테고,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아는 살짝 부풀어 오르고, 풍미가 있으며, 소화가 잘 되는 빵이 인간의 역사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건 빵 이야기를 유독 재미있어 하는 제빵사의 허풍이 아니라 제빵마이스터학교 교재 발효종(Sauerteig) 단원의 맨 첫 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빵은 발효로부터 시작되었고, 발효는 무엇이 다른 무엇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말하자면 미생물들의 이야기이다. 반죽이 어떤 환경에 놓여 그 안에 어떤 균들이 우세하는지에 따라 그것은 과일과 같은 신맛을 내기도 하고 꿀과 같은 달콤함을 내비치기도 하며, 된장과 같은 쿰쿰한 향을 풍기기도 한다. 지금의 제빵사들이야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빵 발효에 탁월한 효모만을 집약해 놓은 이스트나 스타터를 구매해 빵을 만들 수 있지만, 이 균들의 이야기의 매력을 아는 제빵사들은 저마다 다른 발효종을 가지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그렇지만 결국은 유일한 빵들을 날마다 구워낸다.
도서관을 떠난 책들의 이야기와 빵집에 사는 미생물의 이야기는 그들이 함께 놓인 빵의 집에서 다른 무엇으로 변화할 것이다. 빵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들을 타고 넘어가는 책의 이야기들,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 다른 집에 놓이는 빵들, 거기서 다시 피어나는 유일한 이야기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하고도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류지은)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을 읽은 건 기억으론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한국어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다는 걸 최근 검색해 보며 알게 됐다. 2014년에 나는 20대 중반이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기억에 깜짝 놀랐다가, 문득 왜 내 기억은 이 책을 보는 나의 모습을 어린이로 그려 놓았을까 궁금해졌다.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동으로 식빵을 만들어 준다는 네모난 기계를 어디선가 구해온 적이 있었다. 덕분에 일요일엔 온 집안에 갓 구운 식빵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고, 어머니는 뜨거울 때 먹어야 한다며 식빵이 완성되는 시간에 맞춰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잼도 안 바르고 후후 불어가며 뜯어 먹었다. 점심 배가 슬슬 꺼져가는 늦은 오후였다. 식빵의 맛은 같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건 어머니가 별의별 시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빵 레시피는 무척 엉성했고 식구들은 늘 달라지는 맛을 즐겼다. 그 즐겁던 시절의 내가 ‘빵’과 관련하는 이미지가 되어 돌아왔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아마도…
그 책에 관해서라면 나는 기묘하고 희미한 희망의 감각을 떠올린다. 내용이 선명히 기억나진 않지만,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보이지 않는 균들을 관찰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나는 그 이야기가 가진 어두움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건 한편으론 살던 집을 떠나 어딘가의 변두리에서 자신이 돌아갈 진정한 집을 찾는 여정처럼 보였다.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건 멋진 일이고, 그건 언제나 집에 관한 이야기이다. 많은 모험 이야기는 집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험. 저자의 이야기와 얽히며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빵집x도서관>은 빵과 책이 함께 놓이는 일이다. 또 빵과 빵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발효시켜 보는 일이기도 하다. 책은 나선형을 따라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숙어갈 것이다. 화폐로 교환되는 상품으로서의 위상을 약화해 생각해 보면, 빵과 책은 조금 닮은 구석이 있다. 그들은 늘 변덕스럽고 수다스럽다. 어떻게 먹고 읽는지에 따라 그들은 우리에게 매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건 그들 자신도 자기가 무엇이 될지 모르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과 기꺼이 오랫동안 함께 해 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잘 모르고, 그만큼 배울 것이 있다.
그들은 종종 우연을 통해 우리를 완고한 현실이 어긋나는 곳으로 초대한다. 빵집과 도서관의 주인은 신비를 파헤치기 보다는 신비로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 써 보기를, 그 신비가 교환되는 집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어디까지 멀리 가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