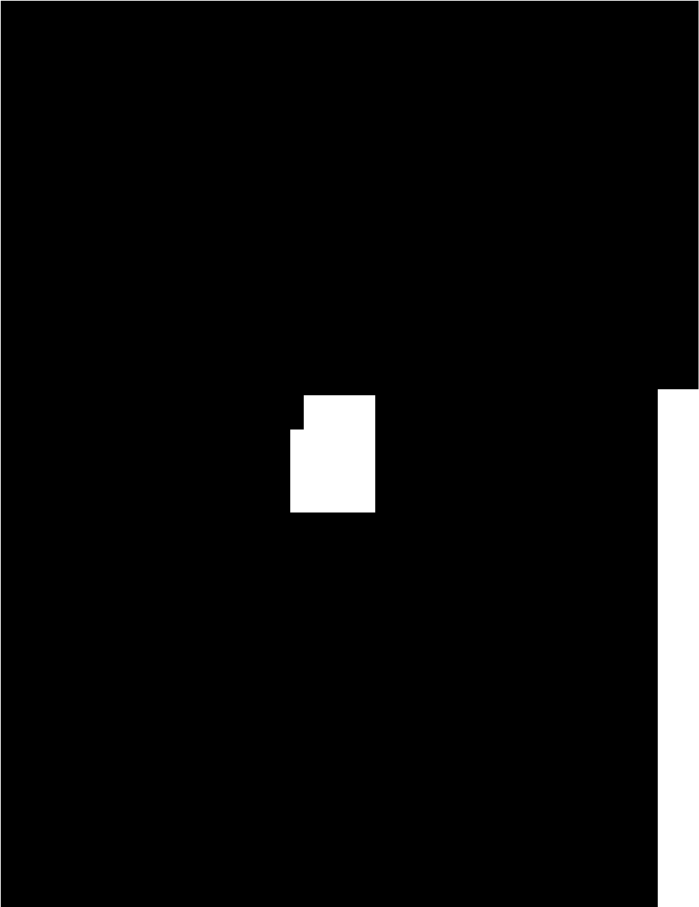정식으로 개관하기 전, 나는 나선도서관에서 두 개의 행사를 꾸렸다. 하나는 나선프레스에서 출간한 박보마 작가의 『사라지는 하루』(2021)의 전시였다. 이 책은 100여개에 이르는 기묘한 형태로 가득한 시끄럽고 일렁이는 그림책이다. 벽과 바닥만 깨끗이 한 상태였던, 조명도 달지 않은 공간에 이 형태들은 1주일을 밤낮없이 머물렀다. 사람들이 이따금 약속 없이 찾아왔고, 테이프로 엉성하게 붙은 그림들은 열어 둔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어오면 제각각 펄럭거리곤 했다. 다른 하나는 음악가 오토모 요시히데와 류한길의 공연이었다. 이건 신중히 기획한 『사라지는 하루』의 전시와는 다른 우연한 초대였다. 오토모가 한국에 올 일이 있어 공연 가능성을 물었으나 (복잡한 여러 맥락에서)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 무산되었다는 류한길 음악가의 말을 듣고, 나는 공연을 위한 설비라곤 아무것도 없지만 괜찮다면 도서관을 쓰시라고 제안했다. 그러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책장이 텅 빈 도서관에서 두 즉흥 음악가의 협연이 이루어졌다. 그날 밤, 공연을 다녀간 백종관 감독은 공연을 끝낸 두 음악가와 관객들의 뒷모습, 의자, 나무, 그림 등등이 한 화면에 담긴 사진 한 장을 “library welcomes noise” 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올렸는데, 나는 이 말을 보고 무척 신이 났었다.
도서관을 어떻게 형성할지 고심하던 이 시기의 일들을 ‘시끄러움’이라는 얼굴을 가진 기억으로 되돌아오게 만든 건 순전히 이재 씨 덕분이다. 김이재 씨는 번역가이자 편집자이고, 지난 해 나선도서관의 1기 도서 위원으로 초대한 여럿 중 하나다. 나는 도서 위원들에게 도서관의 장서로 삼을 ‘나선’과 얽힌 책이나 음반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한 해가 끝나가던 어느 날, 선물처럼, “바로 이렇게 시끄러운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스컴레이드의 2018년 앨범
나선도서관을 만들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건 이곳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지 상상하는 일이었다. 긴 숙고 끝에 나는 나선도서관이 ‘기술적 재생산물’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도서관이 책 만을 위한 곳이 아니길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책을 가능한 만큼 열린 사물로 다루고 싶은 열망이기도 했다. 우리 시대에 살아남은 대표적인 기술적 재생산물은 책, 영화, 음반인데, 나는 종종 그것들이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내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다른 일은 아니었다. 그저 내 몸이 기입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거나, 아니면 신비를 등장시키는 방식이 다를 뿐이거나. 조금 더 세심히 말해보자면 기술적 재생산의 그 형제자매들은 신비라는 하나의 영혼에서 비롯한 서로 다른 몸들이지 않을까 종종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선도서관의 시작점을 이렇게 마련했다. ‘기술적 재생산물의 마술적 가능성’. 그리고 이 사물들이 자신이 품은 신비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선 시끄러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가정해보는 것이다.
시끄러움 자체는 신비가 아니지만 시끄러움은 종종 신비로움을 불러올 때가 있다. 시끄러움은 붙잡히지 않는 것들,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것들이 들끓고 요동치는 일인데, 신비는 아마 그 운동이 무언가를 해내는 순간일 것이다. 예컨대 빵과 와인은 (미생물의) 시끄러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고, 맛있는 빵과 와인은 신비로운 것이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대중의 장치로 현실화한 세계에서 그런 운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정교하게 필터링된다. 이건 억누름으로써 침묵시키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사실인데, 왜냐하면 침묵은 잠재적으로 시끄럽지만 필터링의 기술은 잠재성 자체를 예측하고 격추하기 때문이다. 나는 시끄러움이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는 것이 두렵고, 더욱 두려운 건 신비가 불가능해진 세계다.
상영을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편하게 영화를 봐도 좋다고 안내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같이 온 친구와 얘기를 해도 되고, 책을 꺼내 읽어도 되고, 지겹거나 갑갑하면 나갔다 들어와도 된다고. 이제 더는 그런 안내를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정말로 편하게 영화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스크린과 스크린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웃기고 무례한 일이라고 깨닫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영화 보기의 시끄러움은 그런 관람 방식의 변화로 다다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편한 보기는 규범이 아니라 무언가의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2017년 발행된 『오큘로 005: 시네마 이후, 우리 눈에 비치는 세계』 ‘무빙이미지 플랫폼’ 특집에 뉴욕에 자리한 마이크로시네마 라이트 인더스트리(Light Industry)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공간이 지향하는 난삽한 프로그래밍에 매혹되고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책의 분류라고는 예의 차리는 정도로만 해 놓은, 그러나 어딘가를 또렷이 보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느꼈던 방콕의 리딩룸(The Reading Room, Bangkok), 꼬릿한 발냄새 가득한 좁은 오피스텔에서 모두가 숨죽여 소리에 열중하던 그 옛날의 닻올림같은 곳이 내가 나선도서관을 준비하면서 불러오곤 했던 기억 속 공간들이다. 나는 그곳들의 어떤 순간을 뒤섞어 정말로 시끄러운, 시끄러움이 끊이지 않는 어떤 장소를 만들고 싶다. 그건 작품 그 자체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어쩌면 작품 그것과 깊숙하게 얽혀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