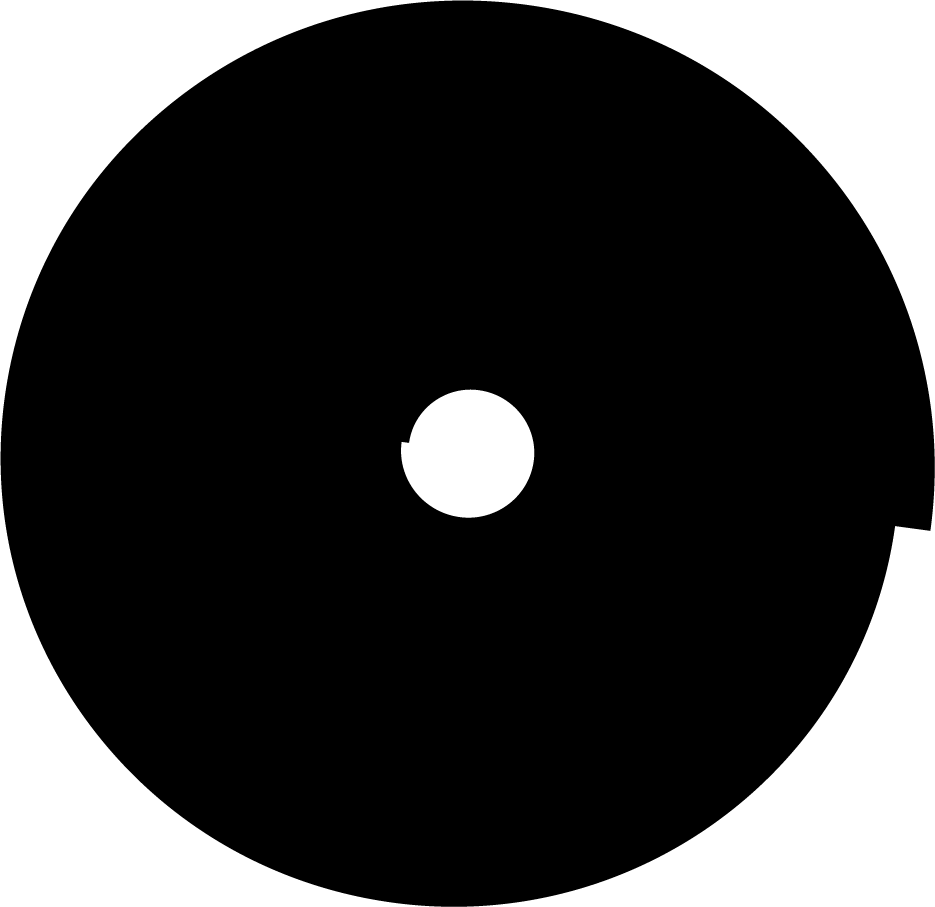인류가 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19세기 말, 제임스 네이즈미스(James Nasmyth)와 제임스 카펜터(James Carpenter)는 『The Moon』(1874)에 과학교육 목적을 위해 달의 면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수록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달을 찍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당시 사용한 콜로디온 습판은 감광제가 마르기 전에 현상해야 했는데, 실제 달을 찍기 위해서는 적어도 5분 이상의 노출시간이 필요했기에 달을 찍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실제 달 대신,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만든 모형 달을 찍었고, 그들이 존재한다고 믿은 활화산을 만들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도 찍었다. 달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은 허구를 과학으로 만들었다.
화성에 갈 수 있다고 곳곳에서 호언장담하는 오늘날, 위의 책과 박민하의 『비밀 호수와 더스트 데블』(2020)은 묘한 대척점을 보인다. 우주를 탐구하고 이를 사진으로 담기에 충분한 과학기술이 생겼고 그 기술이 무한히 발달할 것을 전제로 우주산업이 도래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방정식들은 빈틈없이 완벽할 것 같지만, 이 방정식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 우주를 향한 인간의 사유방식이다. 박민하는 과학적 자료와 사실을 되레 픽션화함으로써 우주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틈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내려 시도한다.
그가 재료로 삼은 것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된 화성 사진이다. 오늘날 카메라를 대여섯 개 탑재한 탐사선들이 직접 화성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수집한다. 탐사선은 화성의 면면을 담아 지구로 전송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된 이 사진들은 언젠가 도래할 화성 탐사, 여행, 심지어 이주를 상상하게 한다. 이 사진들에는 사진 속 절벽의 높이가 1650피트(499.872m)이고, 하야 부분은 화성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얼음이며, 지면의 자국은 모래 폭풍의 흔적이라는 등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캡션들이 달려 있다.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화성은 곧 지구인의 식민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비밀 호수와 더스트 데블』이 보여주는 화성 사진은 익숙한 우주 사진의 문법을 해체한다. 이 책에서 화성 사진은 군데군데 파편화되고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끊어져 있으며 픽셀이 도드라지기도 하고 통신 장애를 암시하는 듯한 선이 그어져 있다. 사진에는 그 어떤 캡션도 없다. 대신 이 책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화성에 관한 사실들을 토대로, 이를 10개의 챕터로 된 하나의 픽션으로 재구성해 보여준다. 사진과 텍스트는 비규칙적으로 교차하며 펼쳐지는데, 사진만 실은 페이지는 가장자리에 흰색 여백을 두었고 텍스트를 실은 페이지는 이미지를 전면에 채우고 그 위에 텍스트를 얹는 방식을 택하여, 10개의 챕터를 리듬감있게 분절하여 보여준다.
이 픽션은 우선 화성에 관해 밝혀진 다음의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해 있다. ‘비밀 호수’는 화성 남극의 얼음층 1.5km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호수이고, ‘더스트 데블’은 화성 표면에 거대한 할퀸 자국을 만들어낼 정도의 힘을 가진 모래 폭풍이며,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화성을 공전하는 두 위성이며, 인간이 보낸 화성탐사선은 태양열로 충전되는 배터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는 나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변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의 과학적 사실들을 21세기 우주신화처럼 바꾸어 써내려 간다. 이야기의 화자인 ‘나’는 화성 탐사선과 교류하는 인간이고, 이미지의 생산자인 ‘그들’은 화성 표면을 끊임없이 사진 찍어 전송하는 탐사선들이며, ‘나’와 ‘그들’은 너무 많은 이미지를 주고받은 나머지 ‘나’의 신체와 ‘그들’의 기계구조는 동기화되기 시작하고,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화성의 두 아들이며, 더스트 데블은 퐈괴적 충동을 가진 생명체이며…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와 이미지를 상호참조하여 보게 만든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사진을 참조하며, 사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를 완만히 봉합해 주는 대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전개된다. 나사 홈페이지의 모든 사진이 캡션을 통해 일말의 미스터리를 남기지 않고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를 정복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이 책은 아무리 판독하려고 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입자, 빛이 지나간 궤적이 남는다. 이야기는 이미지를 판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판독불가능성을 암시하도록 기능한다.
꾸준히 환영의 마술적 작동법을 화두로 삼았던 박민하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소수가 제공한 이미지를 통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도 같은 우주라는 환영의 작동 방식을 그가 구축한 픽션을 통해 보여준다. “행성의 표면을 조각조각 클로즈업하여 기록하는 일은 콜라주 과정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별을 해체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별이라는 것은 멀리서 볼 때만 빛나기 때문이지요”라는 화자의 말처럼, 멀리서 볼 때 빛나던 별은 환영을 거둬내고 가까이서 보면 실은 아무 빛도 발하지 않는 그저 견고한 흙더미일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우주에 무엇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걸까.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이 파괴적인 더스트 데블이라 할지라도, “큰 불운만 없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매 시즌 계속해서 연재될 것”이라고 작가는 화자의 입을 빌려 말한다. 인간은 새로운 탐사선 보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를 개척하려는 욕망 아래, 탐사선은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스타로 인간화되고, 인간은 탐사선의 눈을 빌려 우주를 이해하면서 기계화될 것이다. 작가는 마침내 지구를 벗어난 인간은 더는 인간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를 벗어난다는 것은 단지 몇 개의 도구를 장착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혈관 대신 전선을 심어야 할지 모를 그때를 작가는 네 번째 챕터의 제목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인류 멸망 이후의 세계) 시대로 전망한다. 마치 다 쓰이지 않은 한 편의 영화처럼, 그 끝을 아직 인간이 우리가 상상하긴 어렵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