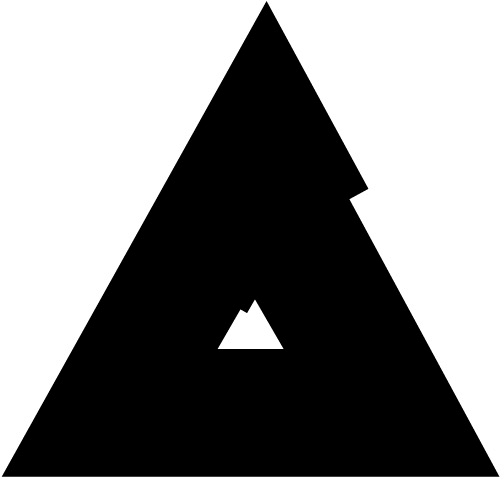개요
스쳐 가는 순간들, 아주 작은 것, 아주 큰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부터 주목해 봅니다. 특정한 순간을 포착한다고 여겨지는 ‘사진’을 슬쩍 외면해 봅니다. 무언가를, 언젠가를 관찰하고 들려주고 들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해해 봅니다. ‘사진’을 둘러싼 조건들을 차례로 살펴 그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봅니다. 무언가를 포착하지 않는 사진술을 모색해 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사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진’으로 불러야 할까요?
수업 계획서
근래 몇 년, 종종 나는 왜 사진이란 것에 관해 이토록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이곤 했다. 사진을 배운 것은 이유가 아닐 것이다. 언제부터일까. 그 이후일까. 이전일까. 추측, 추측해야 한다.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보면, 어머니가 20대일 때 30만 원을 주고 큰이모에게 샀다는 카메라. 1980년대에 배를 타고 일을 했던 이모부가 일본에서 샀다는 그 카메라는 니콘 사의 FM2다. 카메라의 일련번호를 조회해보니 대략 1982~83년에 생산된 모델. 이 카메라는 렌즈를 통과한 빛이 카메라 내부의 거울에 반사되어 간유리에 닿고야 상을 맺는다. 간유리에 맺힌 상을 확인할 때 비로소 사진이 될 준비를 마친 빛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눈을 가진 동물의 수정체가 사방으로 확산하는 빛을 한데 모으는 원리와 닮아있다.
카메라를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내가 앨범 속의 수많은 사진을 봤던 일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와 형제와 부모님과 사람들과 주변을 찍은 사진들은, 기억하는 한 내가 두 세 살쯤부터 몇 년간 반복적으로 본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사진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 낯선 것/사진 속에는 눈앞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멈춰 있고, 단 한 번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언젠가가 어딘가가 있었다. 본 적도 없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은 사진이 되어 앨범 속에 모여있었다. 앨범을 펼쳤던 그 순간 사진에 반사된 빛이 수정체를 거쳐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진이란 것에 이토록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나는 근래에 사진이란 것이 현생 인류의 인식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현생 인류가 가장 많이 본 것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사물도 아닌 사진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사진을 본다. 봤던 것을 보고,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보게 될 것을 본다. 사진을 보고 세계를 본다. 사진을 찍는다. 세계는 사진이 되고, 다시 세계를 본다. 이 과정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 인간의 생애주기를 넘어 이어 반복된다. 사진은 일종의 관습 같은 것이다. 사진 찍기와 보기가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후로 나는 사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켜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특정한 순간을 포착한다고 여겨지는 사진을 슬쩍 외면해 보고 싶다. 따로 또 같이 무언가를, 언젠가를 관찰하고 들려주고 듣고 충분히 오해해 보고 싶다. 사진을 둘러싼 조건들을 차례로 살펴 그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고 싶다. 그 조건 자체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진일까? 그렇게 우리는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사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사진으로 불러야 할까.

일정
2024년 10월 15일, 22일, 29일, 11월 5일 (매주 화요일, 19:00-22:00) [4회]
장소
나선도서관
정원
5명
수업료
24만 원 (분납 가능)
신청 기한
2024년 10월 1일 자정까지
신청자 제출 자료
사진을 처음 본 일, 혹은 사진을 처음 찍었던 일에 관한 에세이(분량 무관).
- 제출 자료를 살펴 수강생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10월 4일 공지합니다.
진행
김익현
광케이블을 통과하는 데이터, 붙잡히지 못했지만 현재에 도달한 과거의 순간처럼 카메라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러나 점점 더 현실에서 위력을 가지는 빛들이 있다. 김익현은 이 빛들을 오랫동안 천천히 뒤쫓으며 사진의 의미, 그리고 기술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는 작가다. 몸(눈)-카메라-이미지로 결속된 사진 장치의 견고함을 무력함을 통해 의심하고, 이 개념으로는 마주할 수 없는, 이미 맹렬히 미래로 향하고 있는 빛들을 생각하기 위한 사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사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추측과 사변이다. «머리 비행»(경기도미술관, 2000), «Looming Shade»(산수문화, 2017)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물결 위 우리», (부산비엔날레, 2022), «투 유:당신의 방향»(아르코미술관, 2022), 미디어시티서울 2016 등의 전시에 참가했다.
수업에 관한 Q&A
‘사진술’ 수업은 사진을 찍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인가요?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사진’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의문을 통해 무언가를 포착하지 않는 사진술, 볼 수 없는 것을 담는 사진 같은 것을 생각하며 지냅니다. 짧지만 이 수업의 과정 끝에 각자의 ‘사진술’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데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찍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업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수강생은 보고, 듣고, 들려주고, 오해해 봅니다. 그리고 ‘사진’이 되는 과정을 짚어봅니다.
이 수업과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을 책이나 작품이 있을까요?
제프리 배첸, 『사진의 고고학: 빛을 향한 열망과 근대의 탄생』, 김인 옮김, 이매진, 2006
에롤 모리스, 『코끼리가 숨어 있다』, 권혁, 김일선 옮김, 돋을새김, 2016
리베카 솔닛, 『그림자의 강』, 김현우 옮김, 창비, 2020
사진을 고민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사진을 고민하다 보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사진은 현생 인류의 인식 틀 같은 것입니다(제가 생각 하기에는요). 사진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나의 인식 틀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넘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손에서 내려놓는 건 사진가에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텐데요, 왜 우리는 위험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사진 찍기와 보기라는 일, 사진 그 자체는 관습에 가깝습니다. 관습에 의심을 품거나 그 관습이 만드는 세계가 아닌 쪽으로 길을 내는 일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 이 관습이 아닌 방식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만 무언가를 포착하지 않는 사진술, 볼 수 없는 것을 담는 사진을 생각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말로 흥미롭기 때문입니다.